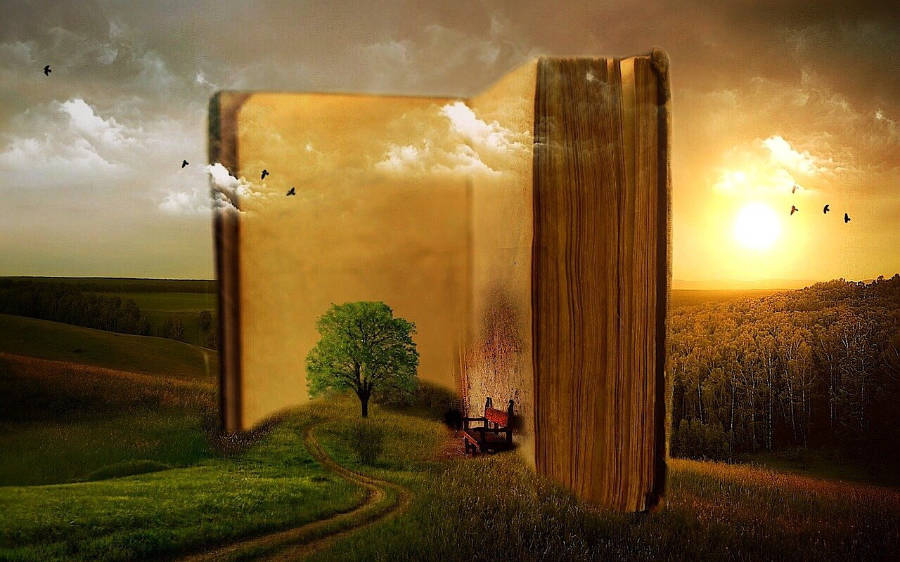
인터넷을 이용해 배울 때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수학의 미적분을 알아보자. 유튜브를 통해 미적분이라고 검색을 하면 무수히 많은 미적분에 관한 동영상이 제시된다. 그중에 하나를 열어 보니 한 학원 강사가 빠른 말로 미적분 공식에 관해 설명한다. 하지만 미적분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좀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몇 개의 동영상을 더 열어 보니 나에게 알맞은 수준의 동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 강사는 미적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차분한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미적분을 왜 배워야 하는지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따로 검색해보니 최초의 미분과 적분, 그리고 누구에 의해 발전되고 왜 미적분이 연구되었는지, 지금 어떤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었다. 수학이 단지 수학에서 머물지 않고 물리학과 역사, 철학 등 인문학으로도 연결되어 더 흥미로웠다.
사실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이들에게 수학이란 쉽지 않은 학문이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수학은 계산 중심이 아닌 이야기 중심으로 접근해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학문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학문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도 철학을 알아야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도 수학을 알아야 한다. 다만 접근 방식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재미도 있고 쉬울 것이다.
혼자 공부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학교 수업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만 혼자 공부할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왠지 공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할 거 같고 그 순서가 정답일 거 같지만, 그 방법이 최선이라 말할 순 없다. 학교 수업의 커리큘럼이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배움의 순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수학처럼 무엇인가를 먼저 배워야 다음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꼭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모르는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곧 순서가 된다. 배워야 하는 순서는 사실 없다. 호기심을 따르는 것이 곳 순서다.
역린이라는 영화를 보고 정조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그래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중에 정조 편을 뽑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사도세자에 대해서도 궁금해져서 영조 편을 꺼내게 되었다. 시간 순서상 거꾸로 되었지만, 관심 있어 하는 것부터 읽으니 연결된 것들까지도 자연스레 넘어가고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게 되었다. 만일 흥미 순서가 아니라 역사 시간적 순서로 읽어야 했다면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사물을 관찰하며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철학적 사고로 질문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학습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습득해 나갈 것이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것은 호기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학습자를 빈 그릇으로 보느냐 스펀지로 보느냐에 따라 교육 방식은 달라진다. 빈 그릇으로 본다면 뭔가를 채워주어야 하기에 지식을 주입해 주는 교육이 될 것이고, 스펀지로 본다면 스스로 빨아들일 수 있게 기다리는 자유학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지혜를 찾아가도록 창조되었다.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것은 다른 생명체들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본성이 있기에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있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이며, 교육은 그들이 잘 빨아들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스스로 빨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넣으려고 한다면, 스펀지는 스스로 빨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빈 그릇처럼 수동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스스로 빨아들일 때는 재밌고 신이 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지겹고 고통스러운 것이 된다.
“교육의 목적은 젊은이에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로버트 M. 허친스)


 아르스쿨링의 향기
아르스쿨링의 향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